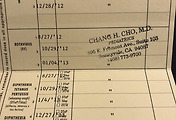이사를 오고 나서 며칠 간 잠을 설쳤다.
새벽에도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기차,
창문으로 들어오는 번쩍이는 자동차 불빛 등,
마치 싸구려 호텔에서 자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어수선함과 불편한 느낌이라니.
소음도 소음이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수시로 방안 불빛이 환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지독하게 까만 밤이 필요했다.
언제부턴가,
나는 깜깜하지 않은 밤엔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기억해보건데, 그건 아마도 이십대 중반부터였을 것이다.
그 전에는 주변이 깜깜하지 않아도 잘 자는 편이었다.
도시의 밤이라는 것은
간판들이 다 꺼진 밤에도 가로등이 빛을 지키고 있기에
아득할 정도로 까만 밤이라는게 존재하질 않는다.
예전엔 그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시골이라고 할수 있는
대부도 근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그 빛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부도에서 약 3년 간 살았었다.
내 기억속의 그 시간들은 주로 자연의 모습이 가득하다.
문을 열면 들큰하게 훅 들어오던 풀냄새,
새벽이면 왁자지껄하게 지저귀던 새소리,
밤에는 밤대로 풀벌레 소리와 개구리 소리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별이 제법 근사하게 보이곤 했는데
동네 자체에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의 소음으로 가득찬 곳이었지만,
도시의 불빛은 하나도 없는 그 곳에서
나는 극한의 어둠을 만나게 되었다.
대부도의 그 곳은
집안 사업이 망해 쫓기듯이 들어간 곳이었고,
그것마저 우리의 소유는 아니었다.
거처를 옮기게 된 그 상황자체가 암울하기도 했고,
거처뿐 아니라 내 생활 역시 다 비틀어져버렸기에
심적으로도 어둠의 시기에 있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게다가 그때 우리집은 심리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셨으며
엄마는 실어증 걸린 사람마냥 말이 없었고
할머니는 하루종일 울기만 했다.
그 안에서 나는 만취한 아버지를 데리러 가야 했고,
엄마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했으며,
할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했다.
그 일년동안 무척 힘들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고,
방통대 공부도 계속 이어가야 했으며,
가족들을 보살펴야 했다.
하루에 4시간 밖에 자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 되었고
자려고 불을 끌 때마다 겁이 덜컥 났다.
너무나 깜깜해서 내 손마저 보이지 않았다.
순수한 어둠, 그 자체였다.
갑자기 펼쳐진 암흑 속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누구도 나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할수 없을 것만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독을 느꼈다.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다.
차라리 빨리 잠들어버리기를.
내가 생각의 전원을 꺼버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어둠보단 덜 무서울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약 일년이 지났을까.
사람이 늘 우울할 수만은 없는 것인지,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 듯 하다.
그리고 나 역시 그 과정에 서 있으면서
어둠 속에서 점차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제 어둠은 막연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서 조금씩 눈을 뜨는 훈련을 하면서
점차 어둠속에서도 나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손가락이 보였고,
방범창 너머 아득히 밤하늘이 보였고,
나무들이 흔들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렇게 깜깜하다고만 생각했던 어둠 역시도
익숙해지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다보니
그렇게 절대적인 어둠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익숙해지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물론 처음에는 그 변화의 낙차 때문에 당황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직시해야한다는 것을,
그래야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만 볼수 있는 아름다움을 만끽할수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밑바닥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끝도 아니었다는 것을.
언제고 나아질수 있다는 것을.
그 후부터인가,
이제 나는 오히려 밝은 밤이 어색해져버렸다.
그렇게 며칠 간을 불면으로 고생하다가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나서야 푹 자고 있다.
미국에 와서 첫 집을 마련했는데,
이 행복한 시점에서
그 20대의 칠흑같은 밤이 떠오르게 될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재밌다고 해야하나, 씁쓸하다 해야하나.
'일상사 > 희.노.애.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학의 수고로움 (12) | 2018.09.19 |
|---|---|
| 남편의 수난기 (10) | 2018.09.13 |
| 미국에서의 첫 교통사고 (8) | 2018.08.08 |
| 시부모님 맞이 준비 (8) | 2018.07.18 |
| 갑자기 집을 사게 되었다 - 4 (18) | 2018.07.12 |